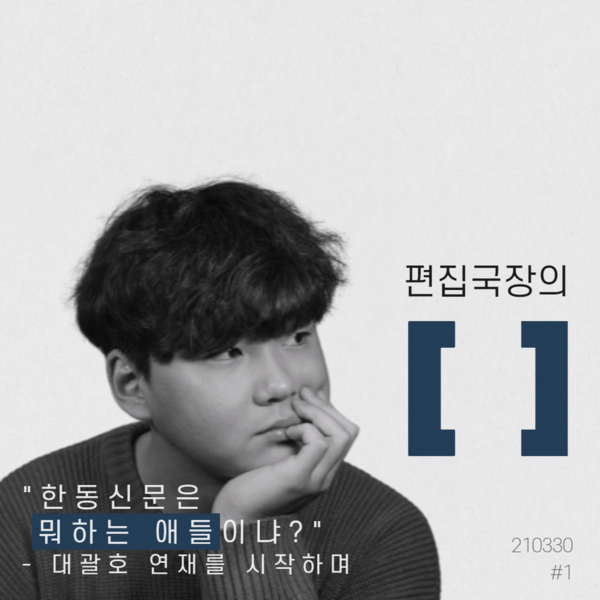편집국장의 [ ] 연재를 시작하며
편집국장의 대괄호는 한동신문이 한동에 던지고픈 질문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동신문이 새로운 글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글이 무언가를 향한 질문이라면, 마땅히 첫 질문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첫 질문은 한동신문을 향한 “한동신문은 뭐하는 애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한동신문은 뭐하는 곳이에요?” “한동신문은 뭐하는 애들이냐?”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같은 것을 묻는 질문이지만, 다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가 섞인 전자에 답할 때에는 괜히 신나지만, 조롱이 섞인 후자에 답할 때에는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심지어 “한동’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단체냐” 묻는 것에는 분명 저의가 있겠지요. 이 역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응당한 비판일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신다면, 기쁘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동신문은 저널리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동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한동만의 저널리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동을 기록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한동 앞에 거울을 세웁니다. 한동에 누구보다 깊이 몰입합니다. 당신에게 닿기 위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신문사를 경영하고, 우리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당신이 보기 좋게 디자인합니다.
실제로 “한동신문 걔네는 뭐하는 애들이냐?” 라는 말은 “[당신이 000이라면?] ‘혹시 비기세요?’” 기사를 작성했을 당시 건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학보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겠지요. 비판을 응당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소음은 누군가가 음지에서 외치는 절규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민감하고, 두렵고,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한동신문 역시 저널리즘의 목적이 누군가의 “불편함”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차별을 멈춰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누군가의 절규가 또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동신문은 그들이 목이 찢어져라 외치던 그 소리를 담아내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뭐하는 애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동신문은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만, 혹자는 소음이라 여길지라도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편함”만”을 담고 있는 저널리즘은 존재 가치가 없고, 혹자의 불평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삼켜내는 저널리즘 역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위태롭게 균형을 맞춰 서있는 일은 아주 어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어딘가 한쪽에 발을 완전히 디디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스물한 개뿐인지라, 그리고 하나 하나가 너무 부족한 몸인지라 한동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숫자로도, 능력으로도 부족한 한동신문인지라 항상 부끄러움을 안고, 불안함을 가지고 저널리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약속드립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무엇이 정직인지, 성실인지, 사랑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리고 한동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쉽게 놓지 않겠습니다.
치밀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조직과, 한계와, 그리고 스스로와 쉽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기사를 쓰는 성실한 기자가 되겠습니다."